STEEL Talk에서는 STEEL(철강)은 물론 Science, Technology, Energy, Environment and Life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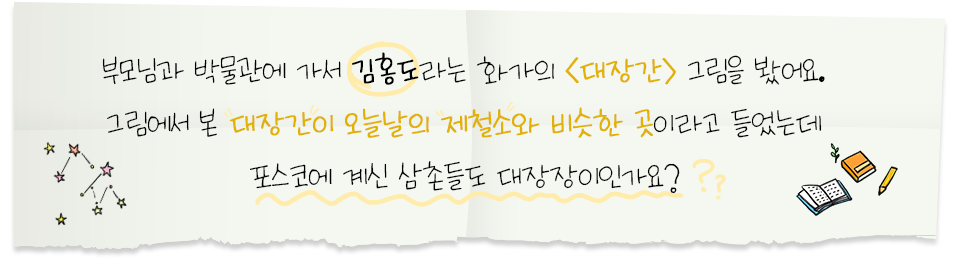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오셨군요! 단원 김홍도의 유명한 작품인 <대장간>에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그 당시만의 시대상이 담겨있는데요. 이모저모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질문을 보내준 어린이가 그림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하네요. 그림 속의 대장간은 철로 된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제철소와 유사한 곳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이 다르기도 해요. 포스코 제철소에 근무하는 대장장이(?) 삼촌에게 귀띔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l <대장간>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 파헤쳐보기
<대장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의 중앙 부분을 보면 대장장이가 달군 쇠를 집게로 붙들고 앉아있고, 다른 두 사람이 망치로 번갈아 메질하고 있는데요. 한 눈으로 봐도 힘이 넘치는 박력과 강한 인상이 느껴지죠? 몇 해 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대상으로 포스코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성스럽다’, ‘강인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철인(鐵人)이라서 그런지, 시대가 흘러도 철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 단원(檀園) 김홍도의 <대장간>, 보물 527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림 중앙에 높게 서 있는 구조물이 보이죠? 사용하던 농기구나 쓸모없어진 쇠붙이를 뜨겁게 달구는 화덕이에요. 이 화덕에 쇠붙이를 넣어 벌겋게 달군 다음 망치로 두드려서 사용하는데요. 그림에서 화덕 뒤에 보이는 소년은 아마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는 장치인 ‘풀무’를 발로 밟아주고 있을 거예요. 화덕 속의 쇠가 충분히 달궈지기 위해서는 바람을 쉬지 않고 불어넣어 숯의 화력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림 중앙에는 세 사람이 서로 역할을 나눠 대장간의 핵심을 맡고 있어요. 달궈진 쇠붙이를 망치로 두드릴 때, 단순히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 지난 스틸톡 4편에서 배웠죠?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를 두드리면 쇠붙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 방울 등이 압착되고, 조직 내부가 균일하고 미세하게 변형되어 내구성이 높아져요. 여기다 뜨거운 쇠붙이를 차가운 물에 담갔다 빼는 ‘담금질’을 반복하면 더 단단해지죠.
<대장간>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쇠붙이로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맨 앞에 환하게 웃으며 낫을 갈고 있는 아이를 보면 쇠붙이를 달궈서 농기구를 만드나 봐요. 김홍도 선생이 그림을 그렸던 조선 후기(18세기)의 대장간은 주로 농업용 도구를 제작했다는 걸 짐작해볼 수 있어요. 참,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는 어딨냐고요? <대장간> 그림에서 용광로는 보이지 않는 군요. 당시의 대장간에서는 쇳물을 만들지 않고 무뎌진 농기구나, 쓸모없어진 쇠붙이를 재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쇳물을 만드는 곳은 철광석이 나는 지역 근처에 있었을 텐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서 충분한 양의 철은 생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l 사회와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쇠붙이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이 워낙 빈약하고, 쇳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장간>이 그려진 18세기 후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다 건너 유럽에선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제국주의와 신대륙을 탐험하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사회와 비교하면 격차가 정말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당시의 유럽에서는 석탄을 활용해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등, 에너지 혁명도 일어나 기계 산업과 철강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점차 철을 다루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쇳물을 만들어 제품까지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일관제철소’가 탄생했어요. 일관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으로 기차도 만들어 운행하고, 대형 선박도 만들어 대양을 항해했죠.

▲ 광양제철소의 모습! 무려 여의도 면적의 5배 규모예요.
과거에는 <대장간> 그림처럼 쇠를 농기계로 재활용하는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오늘날의 철강은 산업 전반의 중심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사회 경제적 역할이 막중해요. 주위만 둘러봐도 고층 타워, 고가도로, 길 위의 자동차 등 철강 없이는 문명의 산물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도시와 사회 곳곳의 인프라는 제철소의 보이지 않는 힘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답니다. 포항과 광양에 있는 포스코의 제철소에서는 철강을 만들어내기 위해 1년 365일 가동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스코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떠받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푸근한 정감이 넘치는 김홍도 선생의 그림 앞에서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밀(?) 얘기 하나 들려드리죠.
<대장간> 속 인물들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조각상이 포항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있는데요. 포스코 직원들의 <대장간>에서 느껴지는 행복하고 푸근한 사회를 만드는 일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