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어디든 갈 수 있던 시절은 잠시 Stop 되었지만, 무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엔 더욱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일까, 가까운 산과 계곡 등 근교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가벼운 장비들과 함께 짐을 최소화해 떠나는 ‘미니멀 캠핑’, 도심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어반(Urban) 캠핑’, 자동차를 이용하는 ‘오토캠핑’ 등 다양한 종류의 캠핑이 있을 만큼 캠핑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여가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캠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말하자면 단연 바비큐(BBQ)! 야외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다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바비큐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뜨거운 그릴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보고 있자면 저절로 ‘그래~ 이거지!’라는 말과 함께 힐링이 되는 기분, 캠핑을 가본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이다.
여기서 질문! 불현듯 궁금해진 한 가지, 바비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실내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굳이 밖에서 굽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럼 오늘은 바비큐의 기원부터 캠핑 필수품인 그릴의 역사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BBQ와 그릴의 역사

우리가 즐겨먹는 바비큐는 Barbeque 약자로 BBQ라고 흔히 쓰인다.
바비큐의 역사는 인류가 처음 불을 이용한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비큐’는 스페인어인 ‘바바코아’에서 유래된 말이다. 바바코아(barbacoa)’란 17세기 남아메리카 아라와크 부족이 고기를 구울 때 사용했던 나무 구조물을 일컫는다.
1700년대 미국 서부지역에 바비큐 문화가 전파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고기를 잘라서 나무 연기로 익히는 훈연 방식 등 다양하게 고기를 먹는 방식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는 숯불 화로 위에 그릴을 올리고 고기를 굽는 바비큐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초기 바비큐 그릴은 고기가 너무 빨리 타버리고, 바람에 재가 날리는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 초기 용접공인 조지 스티븐에 의해 돔형태의 그릴인 캐틀 그릴이 만들어졌다. 처음 캐틀 그릴을 본 주변 사람들은 철로 된 부표를 반으로 잘라 만들어진 모양을 보고 농담 삼아 스푸트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스푸트닉: 소련이 우주개발 초기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
돔 형태의 캐틀 그릴(Kettle Grill)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웨버 브라더스 메탈 웍스(Weber Brothers Metal Works)의 직원이던 스티븐(Steven)이 고기를 구울 때마다 재가 날리는 것을 고민하던 차에 철로 된 구를 반으로 자르고 지지대를 해줄 3개의 철로 된 다리를 용접해 붙이고, 얇은 반구의 형태의 뚜껑을 만들면서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 1951년 웨버의 직원이였던 스티븐이 제작한 최초의 캐틀 그릴과 현재 웨버스테판(Weber-Stephen Products) 회사 전경 (이미지 출처: 위키트리)
이후 그는 캐틀 그릴을 통해 자신의 회사 웨버스테판(Weber-Stephen Products Co.)을 설립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스티븐의 캐틀 그릴은 미국의 전형적인 그릴 디자인으로 여겨지고 있고 가장 성공한 그릴 디자인으로 남아있다.
완벽한 철의 결합=완벽한 그릴

많은 그릴 제조업체들은 그릴을 생산할 때 스테인리스부터 도자기 코팅, 크롬 도금까지 다양한 철재를 결합한다. 각각이 가진 장점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 스테인리스 스틸은 주철만큼 높은 온도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열을 더욱 오래 유지시킨다는 큰 장점이 있고 내구성이 강하다. 또한 햇빛, 바람, 비 등의 거친 환경을 잘 견디기 때문에 야외에서 주로 쓰이는 캠핑 용품에 적합하다.
스테인리스 그릴의 크기는 주철로 만든 그릴보다 큰 편으로 고기를 효율적으로 그슬려 익히기 위해 충분한 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냄새와 변색에 강하여 세균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캠핑 용품은 캠핑족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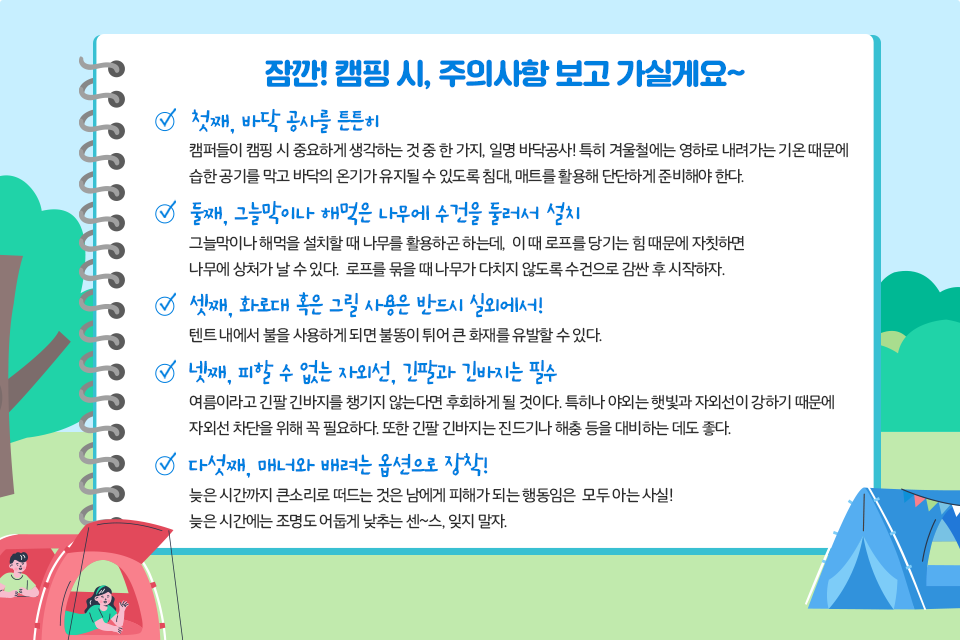
맛있는 바비큐가 탄생한 데에는 다양한 철재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비큐에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은 세월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야외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은 여전하다.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