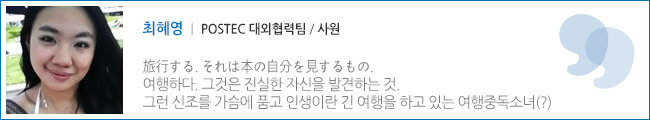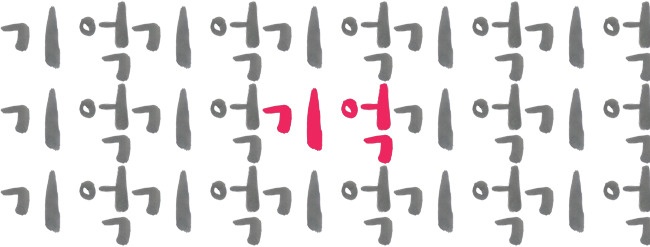
2012년은 여러분께 어떤 해로 기억되시나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분께는 무척 즐거운 한 해가 되셨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가슴 아팠던 분에겐 괴로운 한 해로 기억되겠지요.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런던올림픽은 어떠셨나요?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표팀의 모습에 크게 웃고, 한편으론 어이없는 오심으로 패했던 신아람 선수의 모습을 보고 눈물지었던 분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슬픔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포스텍 생명과학과 김정훈 교수와 권오빈 박사팀이 인간의 뇌가 어떤 작용을 통해 즐거움과 슬픔을 기억하고, 뇌의 정상적인 기억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 메커니즘을 밝혀내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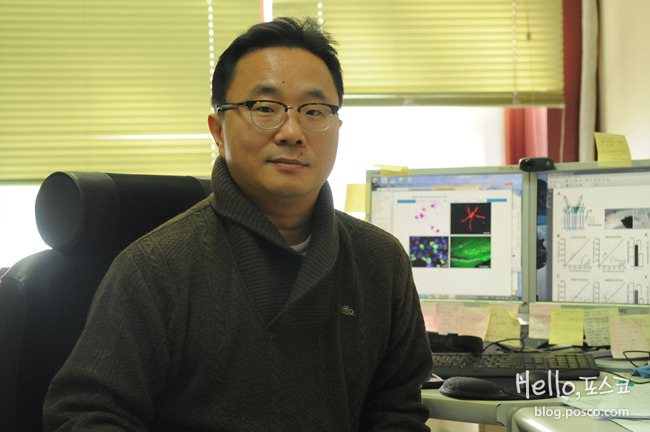 포스텍 생명과학과 김정훈 교수
포스텍 생명과학과 김정훈 교수
글루탐산 수용체의 재발견
우리의 뇌는 신체의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으로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치 ‘컴퓨터’처럼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해 근육, 심장 소화기관과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고, 상상하는 활동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은 바로 이러한 세포들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뉴로리긴(Neuroligin-1)이란 이름의 단백질은 각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부위, 즉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자폐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김 교수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뉴로리긴 단백질 생성을 억지로 막았을 때 동물의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단백질이 어떤 방법을 통해 기억을 유지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밝혀내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뉴로리긴 단백질을 없앤 쥐를 준비하고, 이 쥐의 해마 신경세포에 뉴로리긴 발현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를 주입했습니다. 참고로 해마는 뇌에서 장기 기억과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뉴로리긴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NMDA타입 글루탐산 수용체가 점차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로리긴과 글루탐산 수용체를 관찰함으로써, 이 두 물질이 서로 직접 결합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기억현상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NMDA 타입 글루탐산수용체(이하 글루탐산 수용체)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 사이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너무 활성화되면 오히려 세포 사멸을 초래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을 유지하고, 뇌졸중이나 정신분열증, 자폐증,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즉, 뉴로리긴 단백질이 없으면 글루탐산 수용체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뉴로리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만 글루탐산 수용체를 일깨워 제대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랍니다.
“지금까지 글루탐산 수용체는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 치매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신경정신과에 관련된 여러 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뚜렷한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정신질환의 해법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단백질이 또 다른 수용체와 결합되는 무척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물론, 뇌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사소한 움직임들조차도 신경세포의 정보가 서로 전달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언젠가 이 이야기는 다른 과학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릴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